그럼에도 결국 사람, '아버지의 해방일지'를 읽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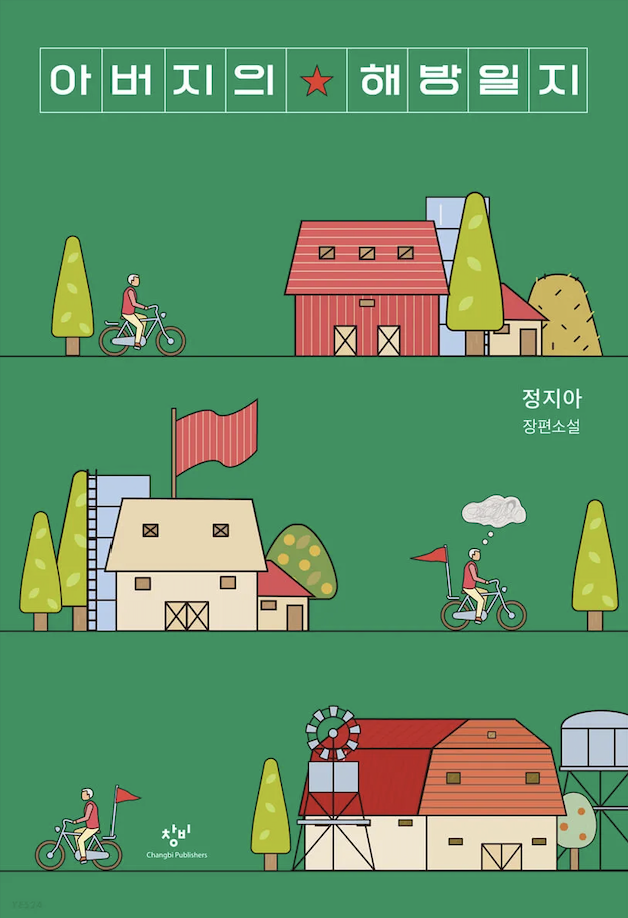
살수록 사는 일은 낯설어지고 마음을 쓰는 사람은 어딘가 미련해 보인다. 사회는 자꾸 우리에게 그림자를 드리우려 하는데 어둠 속에서 빛을 나눠주려는 사람이 부질없어 보이는 것이다. 하루하루 무표정으로 서울을 걷는다. 표정 없이 버스에 올라타고 종업원에게 주문을 하고 학교에서 강의를 듣는다. 그렇게 하루가 끝나고 돌아온 집 안. 다시 어둠으로 잠들고 그림자 속에서 깰 것이다. 갚지 못한 은혜나 무심했던 순간, 남을 무심코 재단했던 장면들이 꿈속에서 아득하게 흘러간다. 그때 더 다정하게 말할걸, 더 헤아릴걸, 한 마디 더 걸어줄걸 같은 잠꼬대를 웅얼거리며. 잠에서 깨면 내 한 몸 지탱하기도 힘겨운데 굳이 남에게 마음 쓰는 사람이 신기해지는 세상이 다시 당연하단 듯 펼쳐진다.
<아버지의 해방일지>는 그런 나와 닮은 주인공의 말처럼 ‘이해할 수 없는’ 마음들이 빼곡하다. 자전적 소설임과 동시에 판타지처럼 느껴진다. 상상만 하던 마음들이 걸어 나온다. 그 마음을 나는 ‘그럼에도 하려는 마음’이라 부르고 싶다. 전직 빨치산이었던 주인공의 아버지는 이미 진 전쟁임을 알고도 동료들과 산에서 나오지 않았다. 먼 친척 보증을 서주다가 빚을 떠맡더라도 아버지는 인간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았다. 아버지가 살려주었던 순경은 삼십여년이 지나 수박을 이고 땡볕에서 두 시간을 걷더라도 아버지를 찾아왔다. 아버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다치자 학수는 아버지가 자원했음을 알더라도 노인정을 찾아가 누가 시켰냐며 호통을 쳤다. 이 마음들의 근원은 정녕 무엇인가. 다들 무언가를 지키려 한다. 아버지는 신념과 동료를, 순경은 은혜를, 학수는 자존심을. 근원은 모두 다르지만 모두 같다. 혼자라면 지켜낼 이유도 없는 것들이다. 그들은 함께 살아가고자 했고 아버지는 단지 유난히 그 가치를 귀중히 여겼을 뿐이다.
함께 사는 일은 치밀한 계산 끝에 함께 있는 게 득이 된다는 냉철한 판단하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그것은 ‘그럼에도 굳이’ 하는 일들이 모여 확장되며, 어찌 보면 미련하고 철없어 보이는 일이라 결국 남는 건 둘 사이에서 공명하는 감정일 뿐이라도 그 감정은 세계 안에 영영 남아 부유하며 우리가 인식하는 세상의 부피를 감각적으로 팽창시킨다. 마침내 불멸하던 감정들이 한 데 헤쳐 모인 아버지의 장례식장. 우정과 은혜와 미움까지 전부. 어떤 모양이든 이제 아버지가 함께한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잠입해 영영 한 자리를 꿰찰 것이다. 그리하여 소설 속 누군가는 굳이 시간을 내어 장례식에 오고 누군가는 왔다가 또 오길 반복하며 또 누군가는 떠나질 못한다. 장례식장에서나마 그 마음을 목격한 주인공의 말처럼, 얽히고설켜 끊어지지 않는 그 마음들이 나는 ‘무겁고 무섭고, 그리고 부러웠다’. 이미 세상을 떠난 자를 부러워할 이유는 재산도 명예도 아닌, 지상에 흩뿌려진 마음의 풍요일 뿐일 테니.
그렇게 이야기는 주인공이 아버지를 기억 속에서 부활시키는 내면의 변화를 차분히 응시한다. 아버지가 생애 동안 빨치산으로 활동했던 기간은 단 4년. 너울너울 흐르는 현대사의 물결 속에서 누군가는 빛나는 윤슬이 되었지만 아버지는 그 부근에서 증발하고 말았다. 그 상흔을 고스란히 떠안은 딸은 아버지를 아직도 고고한 신념을 고수하는 늙은 혁명가로 바라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장례식은 역사가 축조한 드높은 장벽에 틈새를 내고 그 너머를 들여다보게 한다. 누구든 부모님밖에 모르던 시절이 있었다. 나의 가족이자 스승이자 친구이자 우주였던 그들. 잠에서 깨면 그들의 등에 업혀 울고 웃다가 잠이 들었다. 그 소중한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가고 조문객들이 들려주는 농담 같은 이야기들이 주인공의 기억 속에서 그를 다시 써내려 간다. 사람을 믿고 포용했던 한 사람으로서의 아버지, 인간 고상욱으로. 사람이니 실수도 하고 사람이니 용서도 한다던 그의 생각처럼. 비록 그런 생각이 가족들에게 상처를 가져다줬을지라도 그마저도 한 명의 인간을 이해하는 애틋한 증표로 느껴지기도 한다.
물론 이는 그가 세상을 떠났으니 가까스로 베풀 수 있는 너그러움일 수도 있다. 죽음을 거쳐서만 관용이 가능할지도 모를 일이다. 다만 아버지가 입버릇처럼 하던 말, ‘긍게 사람이제’. 책을 덮어도 나는 이 여섯 글자가 뇌리에서 떠나질 않는다. 함께 살아가는 일이 결국 사람은 불완전하다는 사실마저 안아주는 일처럼 느껴진다. 삭막한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서로를 보듬어줘야 한다고, 자꾸 버릇처럼 마음을 쓰며 세계를 부풀려야 한다고 아버지는 말하는 것 같다. 사상과 차이 너머에 우리는 결국 같은 햇살을 쬐고 죽음으로 향해가는 동일한 인간일 뿐이니. 통제 불가능한 세상이 아무리 우리 멱살을 잡고 제멋대로 흔들어 대도 우리만이 우리를 비춰줄 수 있으며 그 미명만이 앞으로 전진하는 유일한 지도임을 나는 잊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문충원 에디터]<저작권자 ⓒ아트인사이트 & www.artinsight.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위로
위로 목록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