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iew] '짧게 잘 쓰는 법'을 쓴 사람은 무슨 글을 썼을까? [도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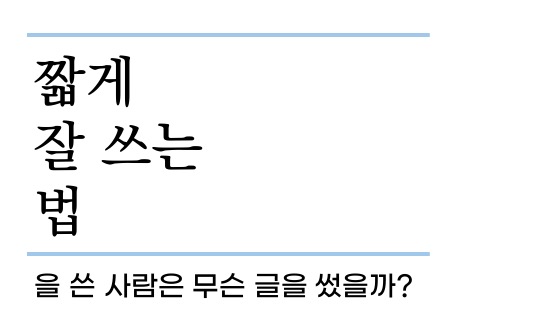
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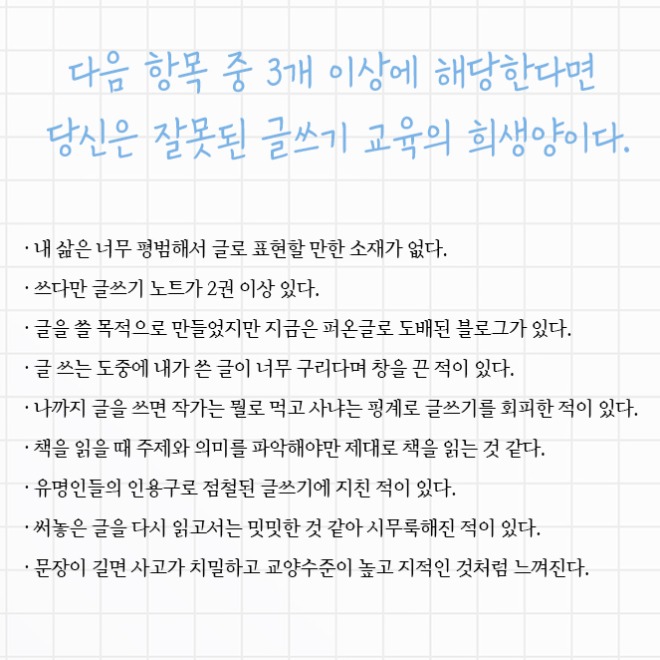
이 책은 소개글로 먼저 접했다. 사실 책 제목은 입술 삐죽하고 흐음 하고 반신반의하며 넘어갔는데 책 소개가 참 사람 혹하게 만들만 했다. ‘다음 항목 중 3개 이상에 해당한다면 당신은 잘못된 글쓰기 교육의 희생양이다.’
쭉 더 읽어 본다. ‘내 삶은 너무 평범해서..’ 패스. ‘쓰다만 글쓰기 노트가 2권 이상 …’ 패스. 패스. ‘글 쓰는 도중에 내가 쓴 글이 너무 구리다며 창을 끈 적이 있다.’ 헉. ‘써놓은 글을 다시 읽고서는 밋밋한 것 같아 시무룩해진 적이 있다.’ 헉. 비록 3개의 항목을 채우진 않았지만 그래도 날카로운 지적이었다고 인정했다.
소개글을 마저 읽었다. 가장 혹했던 문장이다. ‘저자는 무엇보다도 단문을 이용하자고 역설한다.’ 짧은 문장으로 글을 잘 써보자는 작가의 주장이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읽어보기로 했다.
책의 구성에 대해서
목차를 살펴보자.
프롤로그 9p
글쓰기에 관한 짧은 문장들 013p
산문 몇 편과 질문들 193p
실전 문제 215p
쪽수를 보면 알겠지만 글쓰기에 관한 짧은 문장들이 책의 전반을 차지한다. 그 부분에서는 작가의 ‘이렇게 해라’식의 지침이 나온다. 개 중 인상깊게 본 몇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쓴 글을 크게 읽어보세요. 귀가 눈보다 더 똑똑합니다.’ 소리 내어 읽어보라는 것은 어떤 톤과 어조로 읽을지, 어떤 모습을 내보일지 등을 고민하게 한다. 이는 글쓰기가 요구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다. 문장의 의미가 아닌 문장의 결, 속도, 구조, 실재를 이해하는지 확인하며 읽는 것. 소리 내어 읽어야 문장 속에서 거슬리는 것을 잘 발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이상한 문장을 발견하는 것에 기민해지라는 것이 핵심이다.
‘모든 문장을 하나의 단락으로 만들어라 (마침표를 찍고 엔터를 쳐서)’, ‘분석적인 태도를 갖고 문장 구조를 살펴라 (주어가 호응하는 동사와 얼마나 가까운가? 직접목적어가 호응하나)’, ‘품사부터 익혀서 문법과 문장 구조 용어에 대해 제대로 알자.’ 식이다. 좋은 글에는 비문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한다. 제대로쓰기 위해서는 문법 공부가 필수적이구나. 공부.. 해.. 봐야겠다.
글을 읽다 보니 궁금해졌다.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인지, 어떤 글을 쓰는지.
누구 길래 글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걸까? 저자의 프로필을 찾아봤다.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문예창작을 가르치다가, 1997년부터 2013년까지 뉴욕 타임스의 논설위원으로 활동. 매주 또는 격주 꼴로 신문에 그의 글이 실렸고 커트 보니것이나 존 레논 같은 이들의 인물론이나 유전자변형작물에 대한 시사평론 등 매우 다양한 글을 썼다. 그러나 그의 전매특허는 역시 전원생활, 11년 동안 기고한 글을 엮은 책인 <단순하지만 충만한, 나의 전원생활> (출처 한겨레)
네이버, 구글을 찾아봐도 모두 입을 모아 <단순하지만 충만한, 나의 전원생활>이 최고라고 말한다. 도대체 어떤 글일까 궁금하던 차에 출판사 블로그에 미리보기로 올라와 있는 글을 발견했다.
*
10/07
고요하지만 금방이라도 비가 올 것 같은 날, 텃밭의 키 큰 식물들은 앞뒤로 휘청거린다. 꽃대가 진자처럼 흔들리는데도 오색방울새 한 마리는 꽃자루에 앉아 씨앗을 먹고 있다.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고, 꾸준하고 일정한 리듬 위로 이파리들 부딪히는 소리, 장작 헛간 지붕 위로 히코리 열매가 떨어지는 요란한 소리가 겹쳐진다. 곧 구름이 갈라지고 그 사이로 햇살이 쏟아진다. 말 등에서 김이 솟아오른다. 단풍잎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둘 잎이 점점 늘어나면서 곧 목초지 가장자리에 수북하게 쌓일 것이다.
대부분 자연은 내가 허드렛일을 할 때도, 우편함으로 걸어갈 때도, 글을 쓰다가 눈을 들 때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 나는 자연에서 위안을 기대하지 않고, 나의 바람을 투영해 신처럼 떠받들지도 않는다. 자연은 그저 태생적으로 놀랄 일이 없다는 듯 숭고한 무관심으로 존재할 뿐이다. 그러나 나는 가끔 자연에 놀랄 때가 있는데, 사실 그때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은 인간 세상의 변덕이다.
처음에 그 느낌은 9·11테러 이후 엄습했다. 당시 내가 글로도 썼듯이, 뉴욕에서 연일 터져 나오는 새로운 뉴스 속에서 살다가 자연이라는 ‘옛날 뉴스’를 발견한 충격이었다. 나는 지금 또다시 같은 느낌을 받는다. 자연 세계에서는 무엇도 나를 나무라지 않는다. 자연은 아무런 토도 달지 않는다. 경제가 무너져도, 정치가 부패해도, 혹여 개인적 슬픔이 찾아와도 자연은 아무런 말이 없다. 그러나 이 농장의 다른 생물들은, 이 놀랄 만치 긴장된 인간의 계절에 내가 얼마나 사로잡혀 있는지를 상기시켜 준다. 겁먹은 채 사로잡힌 그 느낌, 무언가 근본적인 것을 잊어버렸다는 느낌에서 나는 날카로운 부끄러움을 느낀다.
그게 자연의 속임수다. 자연으로 달아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자연은 거듭 우리를 우리 자신에게로 돌려보낸다. 거위들은 내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꽥꽥 소리를 지르다 이내 저음으로 톤을 낮춘다. 얼룩다람쥐는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살피느라 돌 벽 위에서 얼어붙은 듯 꼼짝 않는다. 레머디는 흔한 말 울음소리를 내지만, 그것은 사실 느리고 깊게, 기분 좋아서 내는 가르랑거림이다. 내 손에 곡물 양동이가 들려 있으니, 그 이유는 분명하다. 나는 또 내 생각에 열중해 있다가, 곡물 통을 들고 언덕 위의 말들을 지나쳐 가면서 그 생각에서 빠져나오고, 그럴 때면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하찮은지를 잠시 느끼지만 이내 또 그 생각 속으로 잠긴다.
이 책에 대한 리뷰를 찾아봤다. “지난날 농촌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이라면 이 책에서 자연과 교감하는 작가의 섬세한 통찰력에 감동을 하게 될 것이다. 어쩌면 지난날 미처 생각하지 못한 기억을 작가의 표현을 통해서 더 생생하게 떠올리고, 지금 시골 생활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생활 속에서 더 큰 기쁨을 보게 될 것이다.” (출처 네이버 블로그 책보기)
<짧게 잘 쓰는 법>에서의 작가의 글은 뭐랄까, 교수님의 강의를 듣는 기분이다. 이렇게 해 저렇게, 이런식으로 생각하면 될 거야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사람이 쓰는 글은 대체 어떤 글일지 궁금했고. 위의 미리보기 글을 봤을 때야 우와 글 좋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멋진 글을 마주하는 기분. 그래서 이번에는 작가가 뉴욕타임스에 기고했던 글을 찾아 나섰다. 번역되지 않은, 그가 쓴 글 자체를 보고 싶어졌다.
I finish reading a book on my iPad — one by Ed McBain, for instance — and I shelve it in the cloud. It vanishes from my “device” and from my consciousness too. It’s very odd.
When I read a physical book, I remember the text and the book — its shape, jacket, heft and typography. When I read an e-book, I remember the text alone. The bookness of the book simply disappears, or rather it never really existed. Amazon reminds me that I’ve already bought the e-book I’m about to order. In bookstores, I find myself discovering, as if for the first time, books I’ve already read on my iPad.
All of this makes me think differently about the books in my physical library. They used to be simply there, arranged on the shelves, a gathering of books I’d already read. But now, when I look up from my e-reading, I realize that the physical books are serving a new purpose — as constant reminders of what I’ve read. They say, “We’re still here,” or “Remember us?” These are the very things that e-books cannot say, hidden under layers of software, tucked away in the cloud, utterly absent when the iPad goes dark.
2013년 8월 10일에 기고된 글로 제목은 Books to have and to hold의 일부이다. (작가의 글은 뉴욕타임스 홈페이지에서 읽을 수 있다.) 영어로 읽으니 더 명료하다. 어려운 문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의 시선과 생각의 흐름을 좇기가 쉽다. <짧게 잘 쓰는 법>의 저자인 만큼 문장도 짧다. 오히려 이 책도 영어로 읽으면 더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잠깐 들었는데 지워버렸다. (그래도 한국어가 편하니까.)
이 사람 말 들어도 되겠다.
책을 비판적으로 읽어라. 어렸을 때부터 줄곧 듣는 말이다. 그래서 나는 이 책을 읽다가 의심을 했다. 이 사람 믿어도 되는 건가? 대체 글을 얼마나 잘 쓰길래 자신의 방법을 따르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 그래서 벌린 클링켄보그가 쓴 글을 찾아 읽었고, 글을 잘 쓰는 사람이 맞다고 납득했다. 나름의 검증시간을 가졌다.
이 책을 읽기 전에 작가의 다른 글을 먼저 읽어보는 것을 추천한다. 이 사람이 세운 글쓰기 원칙이 자연스럽게 궁금해질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스스로 터득한 것인지 직접 느껴볼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쓰는 이 리뷰는 프리뷰다. 이런 글을 쓰는 사람입니다. 믿고 이 책을 읽으셔도 됩니다. 맛보기로 이 사람이 쓴다른 글 읽어보세요 하고 직접 첨부까지 했으니, 맛 보고 가세요.

[우준영 에디터]<저작권자 ⓒ아트인사이트 & www.artinsight.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위로
위로 목록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