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inion] 부드러운 편지가 흩날리는 곳 [도서/문학]
-
시는 단순한 문학 장르가 아니다.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예술 장르다. 흔히 미술관에서 작품을 보고 나름의 해석을 곁들여 작품을 재해석한다. 이처럼, 시에서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해석하고, 누군가는 잃어버린 사물을 해석하기도 한다. 더 넓은 시야를 제공해 주는 시인과 시 덕분에 많은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읽어낼 울림을 얻는다.
아직 시의 세계에 흠뻑 빠져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이 책을 조심스럽게 건네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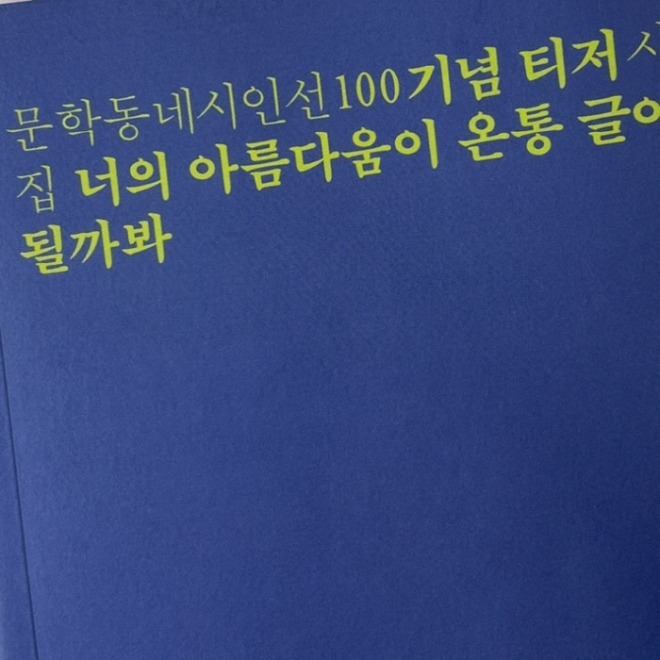
시집 『너의 아름다움이 온통 글이 될까봐』는 티저 시집으로, 여러 시인의 대표작을 모아놓았다. 제목은 오병량 시인의 '편지의 공원'의 일부에서 발췌한 것이다. 해당 시의 전반적인 표현을 분석해보며 인간의 부드러운 모습과 그것을 말하려는 시, 그리고 시집을 소개하고자 한다.
오병량 시인의 ‘편지의 공원'
유월, 공원에 누워 공원을 바라본다 / 방안에 누워 방안을 바라보면서 / 안녕, 네 눈에 내가 보이길 바라지만 / 건조대에 마른 옷가지에선 네 살냄새만 난다 / 어제 입은 셔츠에 비누를 바른다 / 힘주어 잡으면 튀어오른다 부드러움은 죄다 / 그렇다
- '편지의 공원', 오병량
시에서 화자는 방안에 누워 공원을 떠올린다. 건조대에서 마른 옷가지를 떠올리며 셔츠에 비누를 바른다. 꽉 움켜쥐니 비누는 튀어오르고 화자는 그것을 ‘부드러움’이라고 본다.
좋은 분 같아요, 발톱을 깎으며 좋은 사람의 마음이란 게 / 이 떨어진 톱처럼 손으로 모을 수 없는 두려움 같아서 / 뉴슈가를 넣고 달게 찐 옥수수 냄새에 틀니를 다시 깨무는 / 아버지, 나 어릴 적 푸푸푸 하모니카 소리에 왜 화내셨어요? / 그때 왜 나를 나무라셨어요, 지금 그렇게 맛있게 드시면...... / 옥수수 하모니카 얘기는 그만두게 된다
- '편지의 공원', 오병량
부드러운 성향의 사람은 곧 좋은 사람인가? 그렇다면 좋은 사람의 정확한 뜻은 무엇일까. 두 번째 연에서는 좋은 사람, 즉 부드러움이라는 성향에 내재한 ‘두려움’을 그 핵심이라고 보고 사방에 널린 톱으로 비유한다.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부연설명하기 위해 주변에 흩뿌려진 톱 중 하나를 골라 설명하고 있다. 그것은 화자가 옥수수로 장난치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다. 그때 자신을 나무라던 아버지께 전하지 못한 마음을 고백하려다 만다.
그렇다. 화자는 여리고 부드러운, 그리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다.
구름에 네 손끝이 닿을 때마다 빨강거리며 하늘이 깨질 듯했다 쨍그랑, / 이파리 부딪는 소리 몸 하나에 링거를 꽂고 세상을 다 뱉어내는 듯 / 비가 왔다 낮잠을 자고 꿈에서 누군가와 싸웠다 / 짐승의 털이라도 가진다면 웅덩이에 몸이라도 던지겠지만 / 젖은 베개를 털어 말리고 눅눅한 옷가지에 볼을 부비다 너의 아름다움이 / 온통 글이 될까봐 쓰다만 편지를 세탁기에 넣고는 며칠을 묵혔다
- '편지의 공원', 오병량
세 번째 연에서는 인간이 내재한 두려움을 짐승과 달리 표현하는 방법을 말한다. 짐승이라면, 두터운 가죽과 털로 몸을 내던져 어떻게든 방법을 가리지 않고 두려움을 이겨냈을 테다. 그러나 얇고 매끄러운 피부를 가진 인간은 고작 베개를 털어 말리고 눅눅한 옷가지에 볼을 부비는 것이 전부다.
화자는 마음을 고백하는 장치, 편지 또한 부드러움과 두려움을 표현하는 장치로 보고 있다. 편지는 다음 연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따듯하고 정이 많은 인간의 부드러움을 가득 담아내는 좋은 도구다. 그러나 편지 그 이면에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두려움이 가득 모여있는 듯, 편지를 쓰다 말고 세탁기에 넣고 며칠을 묵힌다. 헤어진 연인, 멀어진 친구 등이 수신인의 예시라고 생각해보면 한편으로는 이 맥락을 이해할 수 있다.
당신이 기타와 피아노를 친다는 말을 듣고 몹시 기뻤어요 / 다친 사람을 위해 음악을 연주하고 치료하는 일이 꿈이라고 했지요 /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엄마의 기타는 목이 휘었다고 / 하지만 기타는 계속 배울 거라고 마치 그 꿈을 살아본 사람처럼 / 차분했어요 그 고요한 수면 위에 몸 내릴 수 있는 새가 있을까? / 나의 초라한 발견이 평범한 사람을 울리기 쉬운 새벽이면 틈틈이 편지를 썼어요
고백은 어째서 편지의 형식입니까? 파리한 나무 그늘 밑에서 / 빙빙 꼬리를 물고 돌아가는 개에게도 나는 묻게 된다 / 주저앉아 아무것도 하기 싫었다 다시 태어나도 멈추지 않을 것 같아요 / 그러자 아픈 일을 아름답게 말하는 건 좋은 일이 아닌 것 같다고 / 도무지 아름다운 것이 없는데 당신은 보고 있는 것 같았다 / 공원이었다 그렇더군요 근데 걷고 좋았어요 / 왜 멀리 돌아왔느냐는 내게, 나를 궁금해해줘서 고맙다고 했다
- '편지의 공원', 오병량
이어서 구체적으로 편지의 속성을 말한다. 언젠가 누군가의 일화를 기억해 고백하듯 담담히 써 내려간 편지의 일부를 제시하고선, 초라한 발견으로 진실한 고백을 하면 누군가를 울릴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화자는 방안의 이미지에서 자연스럽게 나무, 개 등에서 차츰 공원의 이미지를 확장하며 빌려온다. 그러면서 빙글 빙글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개처럼, 끊임없이 부드러움을 나누려는 마음과 그것이 멈추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을 언급한다. 두가지 요소가 드디어 충돌하는 지점이다. 이 둘이 상충하는 일은 화자에게 아프고 전혀 아름답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상대방 역할을 하는 ‘당신’은 그런 화자를 위로하듯, 그저 공원을 걷는 것만으로도 좋았다는 말을 건넨다.
공원에서 방안을 생각했다 방안에 누워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면 / 사람이 있구나, 안도했었지 / 멈춘 공은 죽은 공, 죽은 공은 멈춰 좋은가, 던지고 받는 벽 앞에서 / 멈춘 것들이 좋아져서 슬펐다 / 나를 슬프게 해줘서 좋았다고, 실은 편지를 썼어요 / 아무리 볼을 꼬집어도 살아지지 않는 사람에게 /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사람이기를 조심스러워해야 한다는 거겠죠 / 라는 말을 들었다
죽은 공처럼 누가 날 발로 차주었으면 / 들어가지 마시요 끝말이 틀린 경고문 안에서 우리는 튀어오르고 / 골대가 없는 농구장에서 던지는 연습을 했다 / 공을 주면 살아서 / 받아내려고 멈추지 않았다 누구의 공인지도 모른채 / 죽으면 안 되니까, 산 것을 가만두지 않으면 / 견딜 수 없는 죽음이었다
- '편지의 공원', 오병량
그와 달리 주변엔 마음이 멈춰버린 것들이 많다. 상대적으로 그의 부드러움은 지속되기 때문이다. 이 멈춤이라는 것을 죽음과 공이라는 이미지로 연결, 확장시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마지막 연에서의 화자는 자신처럼 죽지 않게. 아니, 말을 조금 바꿔보자면 “계속 살아 있도록" 자신을 발로 차줄 누군가를 기다린다.
부드러운 편지가 흩날리는 곳, 시집
화자처럼 부드러움을 가진 인간들은 타인을 관찰하고 따스하게 어루만져주고 싶은 마음을 편지의 형태로 고백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시의 마지막 연을 통해 자신과 똑 닮은 그런 부드러움이, 죽어가는 것들을 계속 살아 있게 만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금기된 구역에서 튀어 오르는 공처럼 말이다.
‘시’라는 장르도 그렇다. 마음에 꼭 들어맞는 시를 만날 때면 거울로 자신을 마주한 것 같은 반가움을 느낀다. 누구보다 자신을 잘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자신이다. 우리는 독자로서 부드러움을 주고 받는 모든 사람이 될 수 있다.
말 못 할 고민으로 위로가 필요할 때, 튀어 오르다 잠잠해지는 공처럼 지칠 때. 나를 궁금해하고 마음을 어루만져 주며 공감해 주는 시를 기억하길. 그렇게 시인과 소통하며 서로의 부드러움을 나누며 튀어 오르면, 이 세상에 시인과 나만 남는 진귀한 경험을 하게 된다. 그마저도 하나가 되어 온전한 한 사람, '나'로 거듭난다.
시라는 장르가 익숙하지 않거나 부담스럽다면, 또 앞서 소개한 시처럼 내 마음을 알아주는 부드러움. 그것을 시로 느끼고 싶다면, 이 시집으로 그것을 함께 나눌 시인과 시를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박정빈 에디터]<저작권자 ⓒ아트인사이트 & www.artinsight.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위로
위로 목록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