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세이] 무슨 글을 써야 할지 모르겠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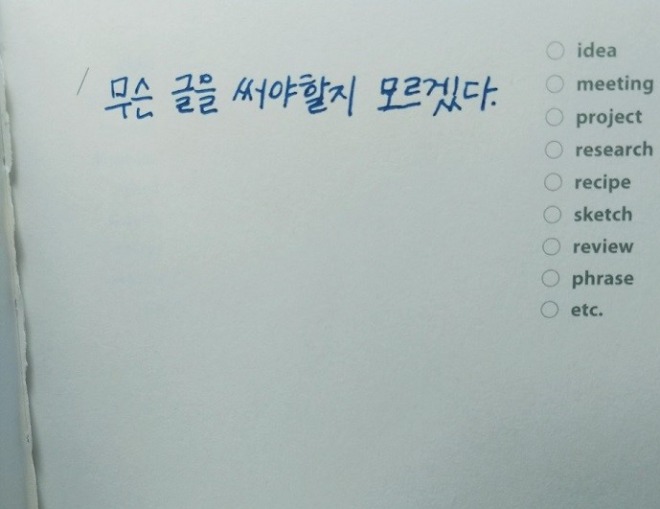
무슨 글을 써야 할지 모르겠다. 누군가가 글쓰기가 막막하다면 '무슨 글을 써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해보라는데 그래도 글이 이어지지 않는다. 다른 때는 어떻게든 한 편을 써냈는데 이번 달은 유난히 어렵다. 이유를 대는 건 자신 있다.
우선은 너무 바빴다. 회사일 마감이 이 에세이 마감과 겹치면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태다. 예측할 수 있었으니 미리 해놓지 그랬냐고 묻는다면... 원래 알면서도 미루게 되는 게 글쓰기가 아닌가. 오죽하면 글은 내가 아니라 마감이 쓴다는 말이 있을까. 여유 있게 마감을 넘기려면 퇴근 후에 한두 시간은 무조건 엉덩이를 붙이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써야 한다는 걸 알지만, 회사에서 하루종일 다른 글을 읽다가 집에 오면 더 이상 활자를 보고 싶지가 않았다. 근 몇 주는 올해 들어 넷플릭스 구독료가 가장 아깝지 않은 시기였다. 생각하지 않고 펼쳐지는 영상을 가만히 보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이던지.
둘째. 솔직해지기가 어렵다. 글을 글로 만들기 위해 떨어져나가는 생각의 부스러기들이 있다. 부스러기들을 털어내며 정제된 글을 쓰다 보면 "정말 이렇게 생각해?"라는 마음속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글 앞에서 솔직해지기가 어렵다. 솔직한 글을 쓰자니 자연스럽게 써지고 할 얘기도 많은 가족이나 친구, 회사 동료 등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소환하게 된다. 하지만 이번에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무나 볼 수 있는 공간에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이 재현되는 건 윤리적인지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한다. 실명이 명시되지 않는다고 해도 껄끄럽고 부끄러운 감정 또는 사건은 다 써놓고도 공개하기가 망설여져 포기하기도 한다. 누군가 내 얘기를 그렇게 쓴다면 나는 용납할 수 있을까.
예전에 글쓰기 수업을 들을 때 한 사람이 달동네를 배경으로 한 소설을 써온 적이 있다. 나는 아름다운 문장들에 감탄만 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은 소설을 통해 특정 사람들을 타자화하는 건 아닌지 늘 돌아봐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무언가를 쓴다는 것은 현실을 재료로 삼는 걸 피할 수 없는 일인데, 그때의 태도와 관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 능숙하게 익히지를 못해서 나는 늘 고민하게 된다. 밍숭맹숭한 글도, 그렇다고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치부를 드러내는 글도 쓰고 싶지 않은데,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가 어렵다.
셋째. 세상에 이미 글이 너무 많다. 글쓰기가 업인 '글 노동자'는 말할 것도 없고 취미로 글을 쓰는 사람들까지 정말 열정적으로 글을 쓴다는 것을 인터넷 서핑을 조금만 해봐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굳이 나까지 글을 더 보탤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달리 말해 절박함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 세상에 내가, 나만이 반드시 써야 하는 이야기라는 게 있을까, 세상에 좀 더 필요한 글을 써줄 수 있는 사람이 나 말고도 많지 않을까 하는 의심들이 솟는다.

글을 쓰지 못하는 이유를 대다 보면 결국 내가 글을 쓰는 이유란 무엇인지로 생각이 수렴한다. "글 쓰는 걸 좋아하니까"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엔 망설여진다. '좋아하니까'가 아니라 '좋아한다고 믿으니까'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할지도 모른다. 무언가를 변함없이 좋아하고 있다는 믿음은 때로 안도감을 준다. 많은 게 변해도 아직 나는 예전의 무언가를 간직하고 있다는 데서 어떤 연속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넌 진짜 어릴 때부터 계속 글을 쓰더니 꾸준하네"라는 친구의 말에 멋쩍은 듯 웃으며 "그러네" 하고 대꾸할 때, 나는 분명히 뚜렷하게 좋아하는 게 있고, 그걸 꾸준히 해오고 있다고 스스로 안심시키고 싶은 마음이 분명 있다.
더 단순한 동기도 있다. 이를테면 '글쓰는 사람'이라는 타이틀 같은 것,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읽고 쓰는 사람으로 '봐주는' 게 좋다. 어쩌다 누군가 내 글을 알아봐주면 종일 들떠 있고, 반대로 왠지 반응이 미미하면 내내 신경이 쓰인다. '스스로 만족하기 위해서', '지나가는 시간을 붙잡아두기 위해서' 같은 말은 글 쓰는 이유를 쓰거나 말해야 할 때 꽤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정말 그런가? 앞에 나온 목소리가 또 들려온다.
내 글쓰기를 지탱하는 것들은 이렇게 작고 불완전하다. 내부에서부터 차오르는 마음보다는 외부로부터 들어온 작은 사탕 하나에 가깝다. 이런 요소가 없다면 나는 언제든 글쓰기의 바깥으로 튕겨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부지런히 읽고 쓰는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 즐거운 한편 마음이 불편해진다. 이렇게 작고 불완전한 것으로 유지되는 씀을 내 것이라고 소개하는 것이 껄끄럽다. 멋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아름답고 단단한 이유가 없다는 사실이 과거에도, 지금도 콤플렉스다. 어쩌면 읽고 쓰는 게 나와 맞지 않는데, 착각으로 지속하고 있는 건 아닌지 착잡해질 때가 있다.
어느 날 그런 고민을 친구한테 털어놓았더니 뜻밖에도 넌 계속 그런 걸 해왔는데, 이제 안 하면 그거 외에 뭘 할거냐는 질문이 돌아왔다. 그러게. 그건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그 물음에 뭐라고 답해야 할지 알 수가 없어서 당황스러웠다. 나와 글쓰기는 정으로 산다는 부부처럼 되어버린 것인가. 그래서 또 별 수 없이 자연스럽게 글을 쓰게 된다. 여기까지 왔으니 어쩔 수 없다는 마음과, 그래도 이게 좋아하는 일이라는 믿음이 뒤섞인 채 나는 또 쓴다. 무엇이든 끄적인다. 자의인지 타의인지 불분명한 이끌림으로.
글이 안 써질 때, 쓰는 것이 괴로울 때, 왜 쓰는지 모르겠을 때, 종종 쓰지 않는 삶에 대해 생각한다. '쓰지 않는 삶'과 '쓰는 삶'이라니 물론 그렇게 이분화하기는 힘들 것이다. 누구나 조금은 쓰면서 살아간다. 여기서 내가 생각하는 쓰지 않는 삶이란 내킬 때 쓰는 일기나 소통을 위한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을 제외하고 굳이 일부러 SNS나 글쓰기 플랫폼에 불특정 다수를 상정한 글을 쓰지 않는 것이다. 쓰지 않는 것 뿐만 아니라 써야 한다거나 쓰고 싶다는 마음도 없는 상태다. 하지만, 쓰는 삶이 별 건가 싶다. 그렇게 살아도 당연히 별 일 없을 것이다.
우연찮은 시작된 내 글쓰기는 작고 부끄러운 이유들로 근근이 희미하게, 매번 반복되는 고민과 회의 속에서 지속되는 중이다. 이것도 사랑일까. 사랑이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을까. 뜨개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뜨개질을 하는 이유가 돈을 벌 수 있어서건, 과정이 재밌어서건,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물건을 만들 수있어서건 많은 고민 없이 뜨개질을 좋아한다고 말할 것 같은데 유독 글쓰기에 대해서 말하려면 생각이 복잡해진다. 언젠가 갑자기 인생이 방향을 틀어 전혀 생각지 못하게 쓰지 않는 삶을 살게 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러지 않는 한 나는 영원히 혼란 속에서 글을 쓸 것 같다. 의심하고, 부끄러워하고, 괴로워하면서.
[김선재 에디터]<저작권자 ⓒ아트인사이트 & www.artinsight.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위로
위로 목록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