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iew] 마음이 아파도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세상 [도서]
-
‘정신과 의사’의 글은 처음 읽었다. 그래서 초반에 볼 때는 문체와 내용, 시사점이 달라서 당혹스러웠다. 딱딱한 문체, 객관적인 수치와 기사 자료 언급으로 인해 사설 칼럼을 보는 것 같았다. 감성을 쫙 뺀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문제들. 나는 병리학 적인 걸 잘 몰라서 불친절하다고 느꼈다.
그런데 보다보니까 이해가 됐다. 마치 숙명이었다. 병원이 아닌 지역사회 현장에서 발로 뛰는 의사로써. 어떠한 고발자 위치. 대변자. 전문의로써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언. 그리고 도움 요청이었다.
우리가 배척하고, 잠재적 범죄자로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려주었다. 정신이 ‘아픈 것’이었고, 신체가 아픈 것과 동일하게 마음이 아플 뿐이다. 그리고 아프니까 약을 받는 거고,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한다. 동등한 사람으로 대해야한다. 범죄율의 통계는 일반인보다 낮다.
하지만 정신병’에 대한 무지로, 편견으로, 오해로, 수용시설을 빙자한 격리로 대할 뿐이다. 함께 살고 의지하는, 현장에 있는 의사로써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원래 특성인지 모르겠지만 사실만을 전하는 담백한 글이 더 가슴이 아팠다.
정신 질환자 이전에 사람이었다. 그들도 아프고 싶지 않았다. 피해주고 싶지도 않고, 그저 한 사람의 몫을 -남들처럼, 정상적으로 지내고 싶을 뿐이다. 하지만 병 때문에 힘들 뿐이지. 환각, 환청, 조헌병 등으로 힘든 사람들도 이전에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버려진 나무는 버려진 자신들이며, 버려진 나무를 조합해 만든 모자이크 모양의 바닥은 버려진 자들이 서로의 능력을 조합해 새로운 것을 탄생시키는 일이었다. 나무 조각을 분류하는 일은 지루한 작업이지만 이러한 일을 할 때는 누군가의 ‘증상’은 ‘재능’이 된다.
강박과 회계 또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합이다. 애정 망상이 있는 사람에게는 전화받는 일이 알맞다. 함구증이 있는 사람의 과묵함은 무게 있는 사장 역할에 제격이다. 이처럼 각자의 증상이나 능력이 합쳐지자 빛나는 하나의 모자이크 작품이 되었다.
공동체의 힘. 사람은 원래 사회적인 동물이다. 혼자서는 살 수 없다. 그리고 서로 다름이 하나의 매력이고, 마음이 아파도 같이 어울리는 삶이 필요하다. 실제로 정신과 의사’ 직업인 안병은 저자에게 들으니 너무 와닿다. 마음이 아프다. 아파서 건조한 문장이지만 읽기가 힘들었다.
격리되는 그들의 삶. 함께 살기 위해 열정적으로 다니는 안병은 의사. 이 책 덕분에 또 하나의 파문, 물결이 되어서 더 어울릴 수 있게, 더불어 같이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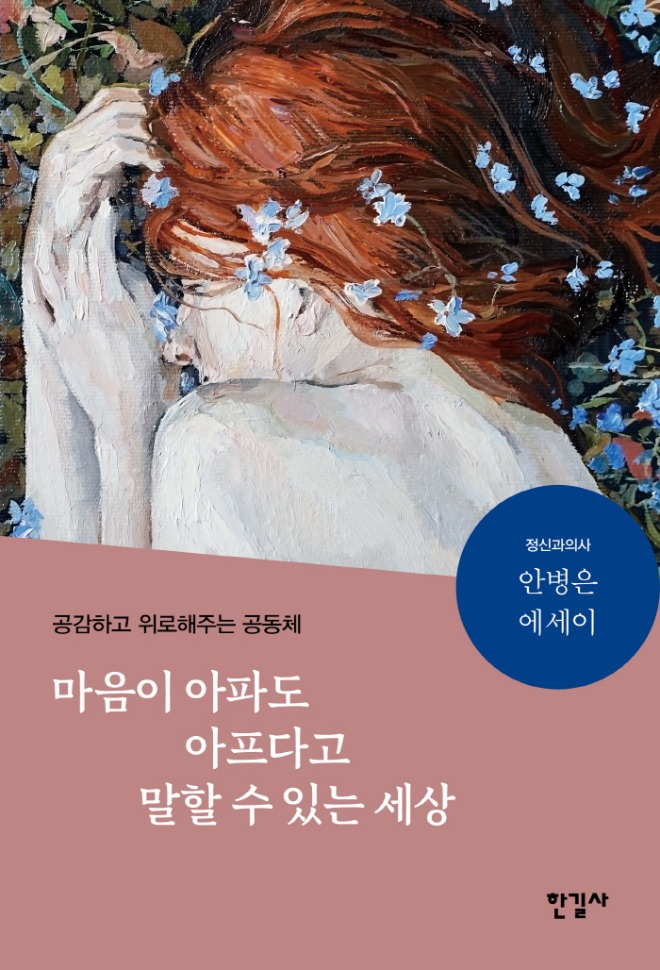 <책 소개>
<책 소개>
[마음이 아파도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세상]은 저자 안병은이 정신과의사로서 꿈꾸는 '사회'에 관한 에세이다. 저자가 꿈꾸는 세상은 마음껏 마음을 아파할 수 있는 세상이다.그는 지금처럼 수용 위주의 치료로는 환자를 제대로 치료할 수 없다고 말한다. 역사적으로 수용 위주의 정책이 어떻게 실패했는지 밝히고 환자의 결정권을 무시한 강압적이고 광폭한 치료가 남긴 상흔을 살펴본다.안병은은 수용 위주의 정책을 탈피하고 탈수용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지역사회 안에서 살아가면서 치료받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안병은은 직접 세탁소, 운동화 빨래방, 편의점, 카페를 열어 정신질환자를 고용해 함께 일했다. 현재는 충청남도 홍성군 '행복농장'의 이사장으로 농업을 중심으로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직접 현장에서 경험하고 느낀 것들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탈수용화가 정착되려면 어떤 점들을 보완해야 하는지 설명한다.이 책은 사회가 '정신질환자'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과 혐오를 드러내 정신질환자가 실제 갇혀 있는 곳은 우리의 편견 속이라는 걸 꼬집으며 환자와 상담했던 내용을 재구성해서 실제 환자의 목소리를 들려주려고 노력한다.사회가 정신질환자를 분리하고 배척할수록 그들은 치료를 기피하고, 자신의 병을 수용하지 않으려 한다. 분리와 배척은 정신질환 자체를 범죄로 만들려는 시도다. 이는 자살, 자해, 살인 등 더 큰 사회적 문제만 낳을 뿐이다. 안병은은 그들을 격리 수용함으로서 그들의 사회적 '자리'를 빼앗는 게 아닌,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게 하는 '돌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망상이나 환청을 숨기지 않아도 되며 중증 정신질환자도 사람대접을 받을 수 있는 세상. 자신의 아픔을 인정받을 수 있는 세상. 마음껏 마음을 아파할 수 있는 세상. 나는 그런 세상을 위한 혁명을 꿈꾼다. 이 책은 나의 혁명에 관한 책이다." - 42쪽"중증 정신질환에 대한 수용 위주의 정책, 그 공포스런 배제의 두려움은 아직도 우리 모두의 생각 속에서 살아 있다. 정신병원은 진정 치료를 위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 병원에서의 치료도 치료다우면 좋겠다. 정말 힘들 때면 병원에 가 쉬면서 치료받고 회복해서 빨리 사회 속 나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게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사회가 되어야한다." - 94쪽*마음이 아파도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세상- 미친 게 아니라 아픈 겁니다 -
지은이 : 안병은
출판사 : 한길사
분야에세이
규격128*188
쪽 수 : 360쪽
발행일2020년 11월 19일
정가 : 17,000원
ISBN978-89-356-6345-3 (03180)
[최지은 에디터]<저작권자 ⓒ아트인사이트 & www.artinsight.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위로
위로 목록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