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inion] 심란할 때 읽으면 더 심란한 책 [도서/문학]
-
참 심란했던 시기가 있었다. 본래 외부 사건보다 심리적 사건은 한 박자 느리거나 지속 기간이 긴 경향이 있다. 모든 것은 끝났는데 내 마음만은 아직 안정을 찾지 못했던 시기였다. 그래서 3주 간 휴가를 내고 산골짜기로 들어갔다. 그렇다고 한들 마켓컬리만은 나를 외면하지 않았으므로 시내에 나갈 일도 많지 않았다.
어떤 날에 오래된 책 냄새가 진동하는 동네 서점이 그리워 집 밖을 나섰다. 그 즈음 나는 재밌는 실험을 설계하고 있었다. 특정 기간에 고르거나 읽었던 책들과 인상 깊었던 문구들이 당시 내 상태 또는 고민거리를 반영할 것이므로 이를 기록해보자는 것이었다. 이 말을 먼저 하는 이유는 최근 참가하게 된 독서모임에서 로이 야콥센의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읽게 되었는데, 당시 시골의 동네 서점에서 구입했으나 내 책장에서 숙면하고 있던 책 중 하나임을 밝히고자 함이다. 뿐만 아니라, 그 시기를 벗어난 나로서는 아주 재미가 없었다. 특히 도입부가 말이다!
그럼에도 글로 적어보고자 하는 것은 모임에서의 논제가 단 하나도 겹치지 않았을 정도로 다양한 생각의 고리를 주었기 때문이다. (한 번 더 말해두자면, 회원들 모두 힘들어 할 정도로 보편적인 재미를 찾기는 힘든 책이다.) 짐작컨데, 책을 구매했을 당시의 나는 이 책의 표지의 평온해 보이면서도 어두운 분위기를 나의 내면세계와 동일시 했을 것이며, 큰 사건 즉 절정이 없어 보이지만 그 수면 아래 요동치고 있는 그 무엇들에 대해 말하는 것 같은 이 책의 쪽페이지에 또 나를 투영했을 것이며, 결정적으로 제목이 ‘보이지 않는 것들’인 것이 이를 대표한 것을 이유로 내 손에 넣고자 했을 것이다.
도대체가 무슨 내용이길래 이렇게 부연 설명이 길까 싶을테지만, 이 책의 서술과 비슷하다. 작은 섬에 거주하는 단 한 가족을 그린 이야기이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모두 그대로 담았다. 지루해 보이는 이유는 뜬금없이 전화해서 힘들었다며 “운동화 끈을 묶었다”부터 시작해서 그 날의 일을 하나하나 다 떠들고 뚝 끊어버리는 친구의 화법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독자는 등장인물의 모든 일상을 들어야 하고 각자의 입장을 이해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가끔 삶에 이리저리 치일 때면 “무인도에나 들어가고 싶다”라는 말을 하곤 한다. 그래서 나도 산골짜기로 도피했다. 그곳은 평화로울 것 같고,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않을 것 같은 곳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나로 대표되는 도시에 사는 이들은, 그 삶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들은 나와 다르게 속 편하게 사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자주 인지하려고 하는 내 오만함을 이 책이 한 번 더 짚어주었다는 점에서 고마울 따름이다.
우선, 결국 자본주의 내에서 아무도 단절될 수 없다는 것을 이 책의 기본 전제로 두는 것이 좋겠다.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이모, 딸로 구성된 이 가족에게 일반적인 ‘사건’이란, 자연재해와 재해를 막을 수 있는 자금 마련이다. 그 뒤에는 당연하게도 나와 마찬가지로 더 좋은 환경에서 삶을 영위하고 싶다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심이 따라온다. 다시 말해서, 꿈이 있다.
잉그리드는 더는 나누거나 자르는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레프세를 굽고, 소젖을 짜고, 크림을 분리하고 치대서 달콤한 치즈와 피클 같은 고메를 만들고, 실을 잣고, 드개질을 하고, 노를 젓고, 수영을 했다. 이제는 거의 모든 걸 할 수 있었다. ~ 지긋지긋해 반드시 이곳을 더나 하녀로 일하러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를 원하지 않았다. 잉그리드는 갑자기 쓸모없는 사람이 된 듯 했다.
이 체계 안에서 우리는 비슷한 삶을 살고 있다. 회사에선 내가 참 유능해 보여서 취업이나 이직 쪽으로 눈을 돌리면 참 보잘것 없어 보이기도 하고, 업무는 능숙하게 하지만 분리수거 앞에선 바보가 되기도 하고 그 반대이기도 하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과 배척하는 곳 사이를 떠돌며 혼란 속에서 헤엄친다. 자본주의와 능력주의는 참 긴밀하게도 이어져 있다. 그리고 능력주의는 다시 시대와 연결된다. 인기 스포츠 종목이 10년 뒤에는 비인기 종목으로 돌아서는 것처럼, ‘운’이 작용해야 한다고들 말한다. 나는 운이 좋게 자본 유통이 빠른 도시에 태어나 도시에 대한 방대한 지식을 체화했고, 섬에 거주하는 잉그리드의 가족들은 그렇지 못하다. 그것이 차이라면 차이겠다.
따라서 독자가 이 가족과 동질감을 느낀다면, ‘자본주의’ 때문임이 명백하다. 이쯤되면 다른 체계와 비교하고 싶어진다. 시장경제 다음이 무엇일지, 그 때의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사건에 노출되어 다른 사고를 가질 수 있을까? 우리와 다른 고민을 안고 살아갈까?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지금의 그 누구도 그것을감히 상상할 수 있을까?
주관적으로 이 섬의 세계에서 가장 큰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이방인 침입 사건’은 ‘자본주의’와 ‘안전’을 함께 묶어두고 있다. 외지인의 방문이 극히 드문 곳에 이방인의 방문, 게다가 그들의 집을 마음껏 헤집고 다니는 그를 위협으로 느끼는 것은, ‘내 것’과 ‘내 것이 아닌 것’을 구분하는 것으로부터 기인한다. 타인의 경계를 침범하는 것은 ‘공격 의사 표현’임이 암묵적이다. 공격을 받은 이들은 세상이 흔들리며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낀다.
거꾸로, 생명의 보장을 위해서 자본주의가 출발했다. 인류는 삶의 영위를 위해 사냥과 농사를 통해 식량을 비축했고,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정량을 보존하기 위해 싸움이 발발하여 영역화가 시작되었다. 생명과 생산이 존재하는 한, 안전의 문제는 계속될 것이며, 피를 보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시장 경제라면, 다음이 있을까?
문득 다음이 궁금해지는 것은 나와 이 섬 내의 등장인물들이 결국 깨달아가는 것들이 너무나도 유사한 것들이라서 이 삶의 고민 접점이 지긋지긋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도망치더라도 어느 곳에서나 발견할 수밖에 없는 나의 문제들을 기피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 차근차근 해결해나가고 있고 꽤나 괜찮은 해결사가 되었지만 때때로 도피하고 싶은 기분이 들 때마다 나를 제 자리에 앉혀 버리는 현실이 얄미울 때도 있는 법이니까.
그렇지만 어쩌겠나. 해내야지. 섬의 가족들도 살아가고. 나도 살아가야지. 뭐, 그런 포기와 의지와 타협 정도가 뒤섞인, 공허하면서도 위로가 되는 그런 상태가 된 채 이 책에 대해 사람들과 차 한 잔 곁들여 토론도 하며 삶을 다시 살아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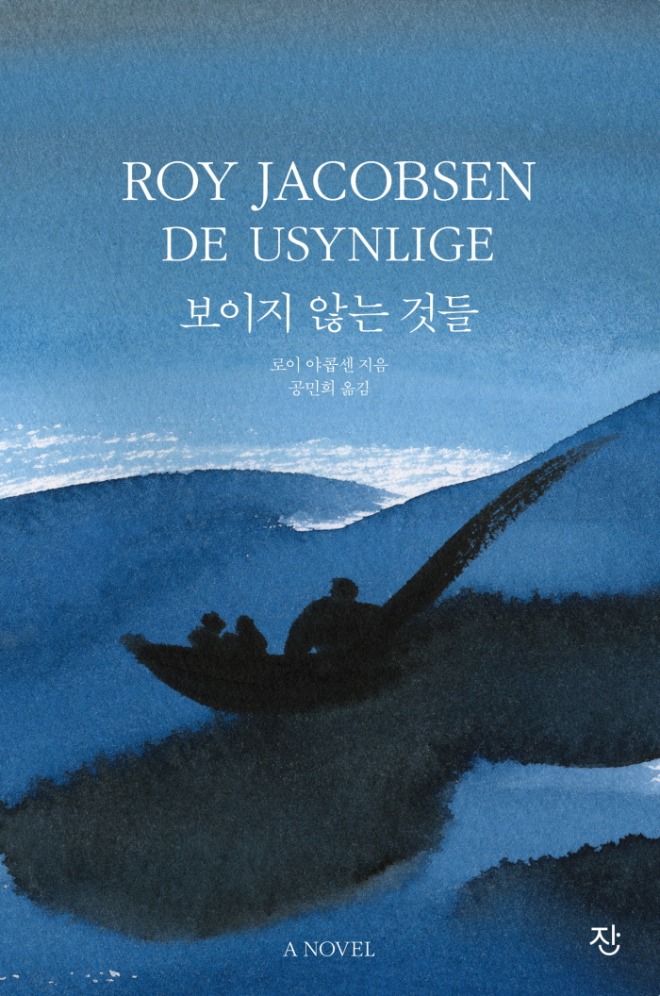
 [박나현 에디터]<저작권자 ⓒ아트인사이트 & www.artinsight.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박나현 에디터]<저작권자 ⓒ아트인사이트 & www.artinsight.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위로
위로 목록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