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inion] Where You '@' [문화 전반]
-
가장 최근 동기들과 만나는 자리에서도 “들어가서 카톡 해”라는 인사와 함께 헤어졌다. 실제로 집에 도착했을 즈음 그날 찍은 사진을 공유하고, 그 이후로부터 잠들기 전까지 간헐적으로 카카오톡을 주고받았다. 자기 전 인사는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귀여운 곰돌이 이모티콘을 덧붙인 “일어나서 카톡 해”였다. 마주 보고 있을 때보다 특별하고 영양가 있는 내용을 말하는가 생각해보면 그건 딱히 아니다. 각자의 신변잡기를 늘어놓고, 그에 따른 반응을 보내는 과정의 반복이다. 한 공간에서 얼굴을 마주하고 있을 때부터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공간이 분리된 이후까지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 24시간 내내 이어져 있는, 바야흐로 초연결의 시대다.
현대인의 필수품, 카카오톡
카카오톡은 현대인의 필수품이 된 지 오래다. 간단한 회의부터 새해 인사, 측근의 생일 확인, 심지어 돈 정산까지도 카카오톡 하나로 해결할 수 있다. 스펀지에 깊게 스며든 슬라임을 분리해내기 어려운 것처럼, 우리 일상과 카카오톡은 이제 불가분의 관계가 되었다.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기능을 어쩜 그리 쏙쏙 집어넣었는지, 아주 사소하지만 꼭 필요했던 기능들이 옹골차게 들어서 있다. 기능이 있기 전까지는 필요한 줄 몰랐으나, 한 번 맛보고 난 후에는 ‘이거 없이 어떻게 살았지?’ 싶은 기능을 영리하게 집어넣어 일상에 긴밀하게 스며들었다. 우리는 더 이상 일상에서 카카오톡을 분리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카카오톡의 ‘1’은 여러모로 혁신적이었다. 피처폰 시절, 문자 메시지는 보다 빠른 편지, 혹은 보다 간편한 이메일의 기능을 대신했다. ‘문자 알’이라는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꾹꾹 눌러 담아 전송하고 상대가 나의 메시지를 읽었을까 궁금해하며 답장을 기다리곤 했다. 스마트폰이 막 보급될 즈음 혁신적으로 등장한 카카오톡은 숫자 ‘1’로 우리의 세상을 바꿔 놓았다. 더 이상 상대가 내 메시지를 읽었을까 마음 졸이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온 것이다. 단지 1이 사라졌는지 확인하면 되었다. 1이 사라지면, 곧 답장이 오겠구나. 1이 사라지지 않았다면, 아직 읽지 않았구나.
그러나 세상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서로와 연결될 수 있는 수단인 SNS의 가짓수가 늘어남에 따라, 불행히도 그 ‘1’은 점차 피곤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상대가 메시지를 아직 읽지 않았다는 본래 지표적 의미를 넘어, 내 메시지는 보지 않으면서 인스타그램 스토리는 확인했다는 표식이 되기도 하고, 내 메시지를 읽지 않는 이유에 여러 복잡한-주로 인간관계에 관련한-설명을 붙여 보기도 한다. 단순한 외형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수면 아래의 것들을 헤아리기에 이미 ‘1’은 너무도 복잡한 의미를 내포한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적당한 시간 내에 1이 없어지지 않으면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든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어쩌면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음에도 항시 연결된 상태에 너무 익숙해진 것일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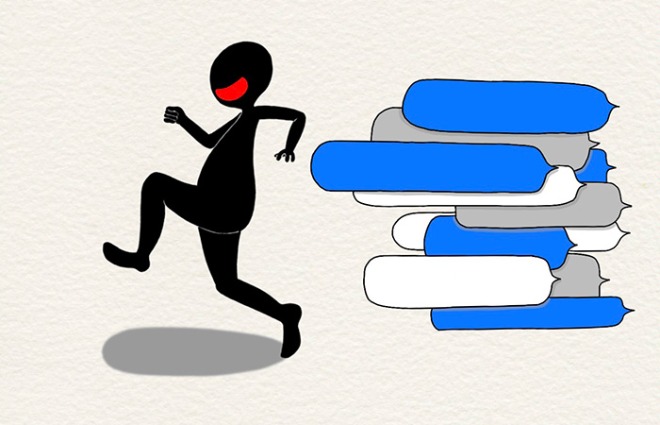
출처: 본인 인스타그램 (@draw_flaw) 카카오톡은 역시 우리 마음을 간파했다. ‘1’을 없애지 않는 사람을 친히 호출하는 기능이 생긴 것이다. ‘@’ 기호 뒤에 상대의 이름을 쓰고 메시지를 전송하면 상대가 알림을 꺼 두었더라도 알림이 전송되어 메시지를 읽으라고 독촉할 수 있다. 중요한 사항을 전달하거나, 급하게 연락이 닿아야 할 상황에서 유용한 기능이다. 그러나 급박한 상황이 아닐 때임에도 몇 번이고 반복되는 ‘@’은 알림을 받는 이의 숨을 턱 막히게 한다. 이 얼마나 쉽고 빠르게 사람을 불안케 하는 기능인지, 때론 연락이란 족쇄에 묶인 듯한 느낌을 받는다.
최근에는 이런 초연결 시대에 질려버린 나머지, ‘과잉 연결’이라는 말에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다. 점점 온전히 홀로 있는 시간이 줄어든다. 우리는 모두 어딘가에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고, SNS는 복잡한 세상을 너무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가끔은 이 모든 족쇄를 벗어 던지고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다. 최소한의 방법으로 ‘알림 끄기’를 선택하지만, ‘@’은 그마저 허락하지 않는다. 우린 어쩌면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게 단절을 갈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Where you @?
과잉 연결 시대에서 우리는 어딜 향해 흐르는가.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저번에 카톡에서 한 얘기’로 운을 띄운다. 마음을 나누어 줘야 하는, 다른 공간으로부터 연결된 대상이 너무 많아 결국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상대에게 온전히 마음을 쏟지 못한다. 결국 서로에게 온전히 집중하지 못한 채, “들어가서 카톡 해”라는 말을 뒤로하며 다음 만남을 기약한다. 집에 돌아오면 피로감과 어딘지 모를 공허함에 연결을 갈구하지만, 그런 스스로가 모순으로 느껴질 정도로 동시에 단절을 갈구한다.
가끔은 피처폰을 쓰던 날이 그립다. 상대가 내 메시지를 읽었는지 읽지 않았는지 확인할 길은 없지만, 그래서 온전한 홀로됨이 보장되었던 날들 말이다. 내게 연결된 모든 것들을 문득 인지할 때면 자문하곤 한다. 과잉 연결 시대의 나는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김태은 에디터]<저작권자 ⓒ아트인사이트 & www.artinsight.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김태은 에디터]<저작권자 ⓒ아트인사이트 & www.artinsight.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위로
위로 목록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