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문화를 업(業)으로, 예술은 취미로 (10)
-
문화를 업(業)으로, 예술은 취미로 (10)
전화, 받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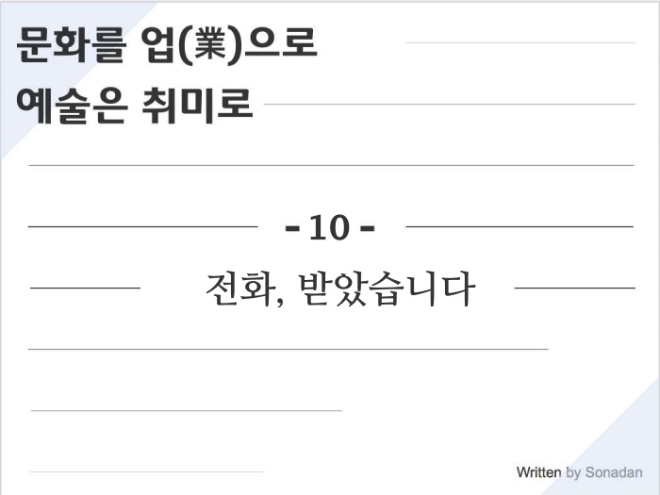
꽤 오랜 시간 동안 연재가 늦어졌다. 하나의 주제로 길게 호흡을 가져갈수록 더 깊은 이야기를 다뤄야 할 것 같아 어떤 것으로 채워야 할까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졌다. 영감을 얻어볼까 하고 사람들에게 요즘 회사 생활에 대해 쓴다고 하며 글을 보여주기도 했다. 앞으로 어떤 주제로 써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하니 꽤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날 있었던 일을 소소하게 일기처럼 써보라고 조언을 건넸다.
문득 너무 무겁게 생각한 건 아닐까,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다. 회사에서 하루에 수십 개씩 일어나는 일들도 재밌게 풀어낼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쓰는 주제들은 잠깐 제쳐두고 일상의 소재와 에피소드를 재밌게 풀어내는 시도를 도전해보자고 생각했다. 그러는 와중에 오히려 자연스럽게 깊은 이야기들도 담기리라 기대하면서.
그래서 고른 첫 번째 소재는 컴퓨터와 마찬가지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구인 '전화'다. 지금에 와서야 익숙해져 눈을 감고도 자주 거는 곳의 번호를 누를 수 있지만 초반에는 그렇지 않았다. 아마 그때 전화를 하는 것은 내가 가장 어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는 일 중 하나였을 것이다.
입사한 지 1일 차, 처음 사무실에 배정받고 다른 선배들은 다들 바쁘게 일하고 있을 때 옆 자리의 전화벨이 울렸다. 이럴 때 전화를 대신 받아야 하는 건 "첫 출근 전 신입사원이 꼭 챙겨야 할 몇 가지 것들"과 같은 유튜브 영상을 보며 배워갔지만 적잖이 당황스러웠다. 받아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혹시나 실수를 하면 어떻게 하지 하고 고민하는 건 둘째치고 다른 자리의 전화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도 알지 못했다. 그렇게 고민하는 중에 전화벨이 2~3번이 울리자 다른 분이 전화를 당겨 받았다.

디스플레이와 특수 버튼은 없지만 다양한 기능이 있는 유선전화 그날 이후 선배들이 전화기 조작법에 대해 친절하게 알려주었지만, 전화를 걸고 받을 때 입력하는 커맨드들은 생각보다 복잡했고 일주일 간은 이 단축키를 잘못 눌러 당황하는 등 적응하는 데 꽤 시간이 걸렸다. 사무실에 들어가면 꼭 한 두 명은 수화기를 붙잡고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다른 어떤 일보다도 전화를 잘 주고받는 것이 꽤 중요할 것이라는 사실은 꽤 부담으로 다가왔다.
전화기 조작법 같은 것이야 배우면 그만이다. '전화 공포증'까지는 아니지만 전화와는 그렇게 친숙하지 않았던 나는 전화를 걸고 받는 과정에 익숙해지는 데 꽤 많은 시간이 들었다. 이런 건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는 적응 기간이 필요한 소통 방식이었기 때문에 꽤 오랜 시간 나를 힘들게 했던 것 같다. 전화하기 전에는 늘 메모장에 시나리오 1부터 3까지를 써놓을 정도였으니.
1년이 조금 지난 지금은 아직도 부담스럽고 받기 싫은 전화도 있는 건 여전하지만 대체로 전화와 익숙해진 것 같다. 내 자리의 전화기도 위 사진과 같은 버튼만 있는 전화기가 아닌 디스플레이와 다양한 부가 버튼이 있는 최신식 전화기로 대체되었고, 이제는 망설임 없이 전화를 받아내기도 한다. 가끔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다 업무 전화를 받으면 적잖이 당황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평소엔 전혀 내지 않는 하이톤의 목소리에 그동안 접해보지 못했던 안부까지 묻는 친절함이 그들에겐 낯섦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OOO입니다. 네, 아 저번에 말씀하신 것 맞죠? 제가 내일 살펴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요즘 잘 지내시죠..?"
또 사무실에서 받는 전화는 곧 나의 소속과 일을 대표한다. 한 사람이 맡는 업무에 대해 합의한 소통 방식이자 소속을 함께 상징한다. 집에서는 전혀 쓰지 않는 내선 전화가 자리에 하나씩 놓여 있는 이유도 여기 있다. 어느 정도는 정해진 방식으로 받아야 하고 협력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원하는 응답을 해주어야 한다. 더군다나 공공기관에서는 이곳에 전화를 건 시민들과 예술가들에게 친절하게 응대하고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기도 해야 한다.
특히 외부 공개 행사 혹은 지원사업의 참여자 모집 공고 기간 동안은 정말 전화에 심혈을 기울여야 했다. 친절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매번 찾아볼 수는 없으니 언제라도 대답할 수 있도록 익숙해져야 했다. 언제 전화가 걸려올지 모르니 자리를 비울 때도 조마조마했다. 예상 질문과 답변을 아무리 준비해두어도 수화기를 넘어 연락을 주는 사람들은 늘 예상 밖의 질문을 들고 왔다. 경험이 부족한 담당자는 당황하면서 연락처를 적어두고 알아보고 연락드리겠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다.
또 전화를 주고받는 사람 중 한 번도 마주치지 않을 사람들도 있다. 그들이 나(와 나의 사업, 그리고 회사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오로지 이 전화 통화 하나가 될 수도 있다. 앞으로도 우리의 사업에 참여하고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첫 대면인 전화부터 제대로 시작해야 할 것이다. 누군가에게 전화로 편하고 좋은 인상을 심어주면 얼굴 한번 보지 않고 전화만으로도 좋은 관계가 생기기도 하고 그 이외의 일도 더 잘 풀리기 마련이다.
이처럼 전화는 자칫 소홀하게 대할 수 있지만 업무에 있어서 꽤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문득 전화처럼 사소하게 생각했지만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던 건 아닐까 돌아보게 된다. 어느새 입사한 지 1년 하고도 다섯 달이 지난 지금도 막 출발점에 있는 순간이겠지만 체감하지 못한 채 꽤 많은 시간이 지나버린 것 같다.
다시금 전화 벨소리가 울린다. 전화를 받다 보니 이 사무실이 익숙하면서도 낯설게 느껴진다. 알람소리에 잠이 깨듯 정신을 차린다. 바쁘게 돌아가는 일과 일상에 치여 나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돌아보는 시간이 부족했던 건 아닌지 돌아본다.
[손민현 에디터]<저작권자 ⓒ아트인사이트 & www.artinsight.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위로
위로 목록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