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iew] 그의 문학적 언어로 그려낸 문학 - 헤르만 헤세, 음악 위에 쓰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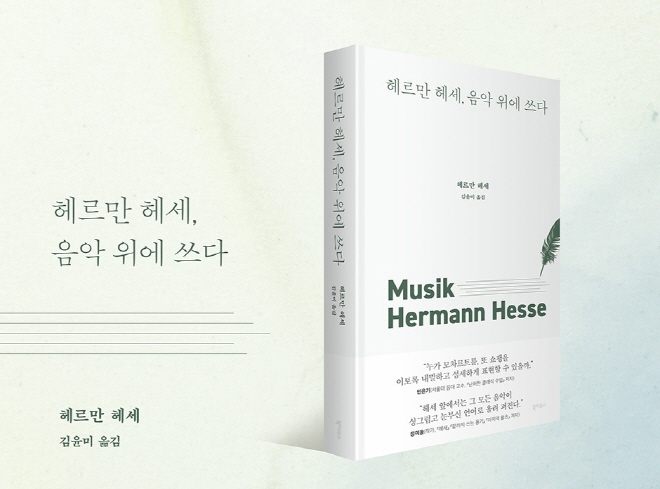
한국에서 헤르만 헤세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소설을 거의 읽지 않는 나에게도 이미 익숙한 작가이고, 그의 책도 몇 권 읽었다.
특히, <데미안>은 좋아하는 작품이라 몇 차례 반복해서 읽었고,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 데미안에서 등장하는 ‘알을 깨고 나오는 새’ 표현을 많이 인용한다. 나에게 소설가로서 친숙한 그의 음악 세계가 궁금해져서 이 책을 펼치게 되었다.
<헤르만 헤세, 음악 위에 쓰다>는 헤세가 기록한 음악 단상을 모은 책이다. 음악은 헤세의 문학 세계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이다. 이 책을 기획한 헤르만 헤세 전문 편집자 폴커 미헬스는 헤세가 젊은 시절부터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쓴 모든 글 가운데 음악을 대상으로 한 글을 가려 뽑아 ‘완전한 현재 안에서 숨쉬기’와 ‘이성과 마법이 하나 되는 곳’ 등 두 개의 장으로 나누어 실었다.
첫 장을 펼치는 순간 느낀 감정은 당혹스러움이었다. 근 1년간 다양한 음악 관련 서적을 읽었지만, 이렇게 음악에 대해 서술하는 책은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보통 음악가의 생애, 특징, 성격 등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어떤 음악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나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 서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헤세는 그렇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음악을 들으러 가기까지의 그만의 감정을 그의 문학적 언어로 표현했고, 그가 음악을 듣는 순간 또한 그렇게 풀어나갔다. 비로소 음악을 이성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진정 감각적으로 느끼는 순간인 것이다.
오르간 음은 점차 커지면서 어마어마한 공간을 채우더니 음 스스로가 공간이 되어 우리를 온전히 휘감는다. 음은 자라나 편안히 쉰다. 다른 음들이 합류한다. 별안간 모든 음이 다급히 도망치고 추락하고 몸을 숙여 경배하며, 문득 치솟다가 제지되어서는 조화로운 베이스 음 속에 꿈쩍 않고 머문다. 이제 음들은 침묵한다.
그는 이런 식으로 그의 문학적인, 감각적인 언어로 음악을 온전히 느끼고 표현해 나간다. 이 감각적인 언어는 마치 독자 또한 헤세와 함께 같은 공간에서 동일한 음악을 즐기고 있는 듯한 착각을 하게 만든다.
또한 그는 “교향곡”, “연주회”, “아다지오”, “안단테” 등의 음악과 관련된 표현들을 주제로 하여 시를 써 내려 간다.

훌륭하고 건강하며 여운이 오래 남는 예술은 집단의 휩쓸림이 필요 없는 분위기와 영혼 상태일 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제 영혼은 감동, 쾌활함, 경건함, 신성함에 휩싸였지요. 그런 진짜 예술 체험을 하고 나면 그런 영혼의 상태는 몇 시간이고 계속되었습니다. 때로는 며칠 동안 이어지기도 했지요. 그건 마취나 감각을 헤집어놓는 흥분이 아니었습니다 명상과 정화, 그림자 없는 환한 빛이었고, 생의 감정과 정신적 추진력이 강하게 일어나고 밝아지는 일이었습니다.
헤세가 느낀 이 순간이 바로 음악을 통해 느낄 수 있는 카타르시스의 순간이 아닐까.
음악은 우리의 마음을 정화한다. 카타르시스를 선사하는 음악은 공연이 끝난 후에도 몇 시간, 더 나아가 며칠 동안 우리의 의식과 감각에 머무른다. 이런 감각을 선사하기에 음악은 인간으로부터 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우리의 본질과 맞닿아 있는 존재가 된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음악을 좋아하는 이유이다.
[김소정 에디터]<저작권자 ⓒ아트인사이트 & www.artinsight.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위로
위로 목록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