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S] 나의 싱클레어가, 우리의 데미안에게 - 데미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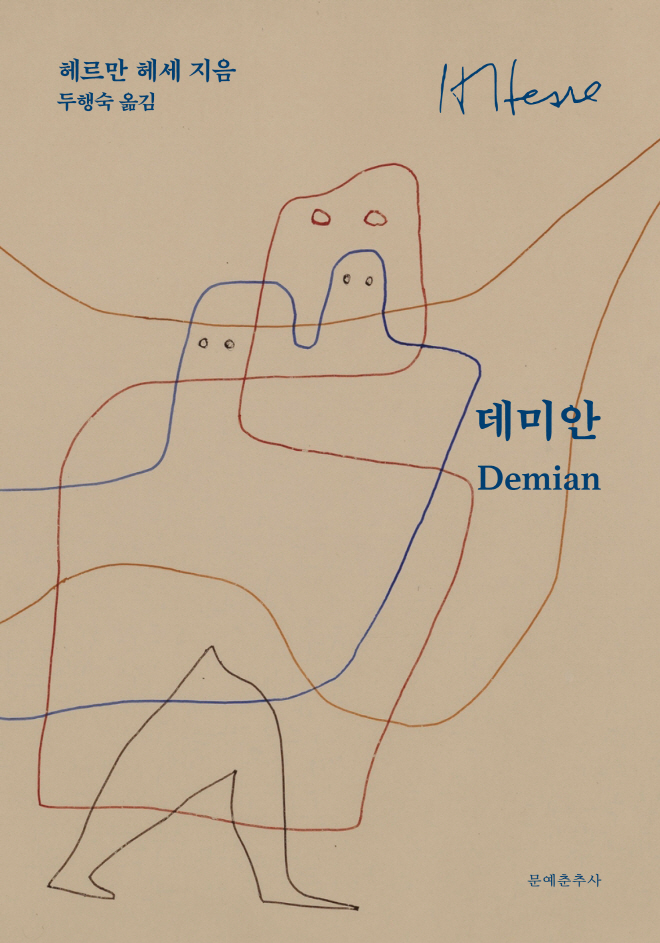
어렸던 나는 꽤 사고뭉치였다. 서른을 앞둔 지금에야 차분해진 편이다. 그때의 나를 되돌아보면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런 녀석을 어떻게 참고 견뎠을까 싶다. 액션 영화를 보고서는 스파이가 되고 싶었는지 낚싯줄을 온 방에 감아 놓은 적도 있었고, 잘 가다가 넘어져 이름 모를 어떤 분의 가게 유리문을 박살 냈다. 또 어떤 날에는 동생과 한바탕 싸우고 집을 난장판을 만들어 놨다. 육아는 전쟁이라는 말이 틀린 게 하나 없다는 걸 나를 통해 깨달았다.
잘못 한 날이면 어김없이 부모님께 혼났다. 당연한 일이다. 그래야 다음에는 이런 짓을 안 할 테니 말이다. 다만 그런 경험들이 내 안에 두려움을 키워버렸다. “아, 이건 잘못된 거구나”라고 생각해버리면 일단 숨기려고 들었다. 어쩌면 다들 어렸을 때는 그랬을지도 모른다. 어린 날의 우리에게 일의 수습이나 책임보다는 ‘혼난다’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으리라. 어린아이가 두려움을 스스로 이겨내는 일은 무척이나 어렵다. 그러니 먼저 나서서 고백하는 것 따위는 할 수 없었다.
[깨달은 인간에게는 오직 한 가지 의무밖에는 어떤, 그 어떤 의무도 없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찾는 것, 자기 자신 속에서 확고해지는 것, 그리고 어디로 인도하든 간에 줄곧 자기 자신의 길을 앞으로 더듬어 나아가는 것이었다. 이러한 인식은 나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나에게 있어서는 이 체험에서 얻은 결실이었다.] (178쪽)
나이가 한 자릿수에 머무르는 동안은 그게 두려움이라는 것조차 모른다. 나이가 두 자리로 바뀌고, 청소년기에 접어들어 사춘기를 겪고 나서야 우리는 그 감정의 정체를 알아차린다. 크게 달라지는 건 없다. “두려움을 이겨내야지!”가 아니라 “두려움을 이겨내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소망만 품는다. 행동과 태도는 그대로다.
독일의 싱클레어도, 한국의 나도, 어떤 나라의 어떤 곳에 있을 누군가는 그 동경에 인격을 담는다. 그것이 세상에 나오며 우리에게 다가온다. 저기에 우리들의 막스 데미안이 손을 흔들며 인사를 건네고 있다.
나와 당신은 데미안을 만나 그와 많은 일들을 함께하고, 수많은 대화를 나누며 그와 가까워진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 그 순간이 찾아온다. 현실을 직시해야만 할 순간. 데미안은 싱클레이어이며, 싱클레어는 우리라는 것을 마주해야 한다. 내가 나에게 떠드는 독백이라는 잔인한 현실을 마주해야 한다. 끝없이 주고받던 말과 행동에 담긴 우리의 자아, 괴로움, 성장, 행복, 만족감 따위를 눈앞에 늘어놓고 하나하나 들여다봐야 할 때가 됐다는 현실은 퍽이나 괴롭다.
하지만 벗어나야 한다. 견뎌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는 어른이 될 수 있다.
[나는 자연으로부터 내던져진 존재였다. 불확실한 것 속으로, 어쩌면 새로운 것을 향해서, 어쩌면 무(無)를 향해서 내던져진 존재였다. 그리고 본래의 심연으로부터 나온 이 내던져짐을 실현시키는 것, 그것의 의지를 나의 내부에서 느끼고, 그것을 온전하게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 오직 그것만이 나의 사명이었다. 오직 그것만이!] (179쪽)
데미안의 죽음을 환영할 수밖에 없음에 더욱 사무치게 슬퍼진다. 나의 동경이자, 당신의 소망이었고, 아무개의 구원이었을 데미안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사라져야만 한다. 그가 남아있는 한 우리는 싱클레어에서 벗어날 수 없다. 영원히 데미안을 쫓으며 그가 메시아라고 믿으며 눈먼 자의 도시에서 살아가는 싱클레어로 살 뿐이다. 그래서는 안 될 일이다. 우리는 새가 아니라 인간이니까. 우리는 아브락사스를 믿어서는 안 되니까.
우리는 싱클레어와 데미안의 손을 맞잡고 아브락사스에게로 날아가는 새를 바라보며 “이제 그만 돌아가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니까.
 [김상준 에디터]<저작권자 ⓒ아트인사이트 & www.artinsight.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김상준 에디터]<저작권자 ⓒ아트인사이트 & www.artinsight.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위로
위로 목록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