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inion] 지키기 위해 변해야만 하는 : 생물과 무생물 사이 [도서]
생물과 무생물 사이 - 후쿠오카 신이치
글 입력 2018.05.27 23:29
-
모순이다. 무언가를 지키고자 변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이미 달라진 이상, 기존의 것을 지켰다고 말할 수 없지 않은가. 그럼에도 그 모순을 해내는 것이 비로소 생명이라는 타이틀을 얻는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많은 것을 바꾼다. 끊임없이 변하는 것들 중 상당 부분은,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몸이 해낸다.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현재 지니고 있는 피부, 혈액, 심지어 뼈 까지도 이전과는 다른 것이다. 창조와 파괴를 반복하며 평형을 유지하는 모습이, 생명이 동적 평형 상태에 있는 흐름이라는 정의를 이해하게 한다.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에 그치지 않는다. 동적 평형 개념을 적용하면 인간은 사는 동안, 살기 위해 셀 수 없을 만큼 죽는다고 말할 수 있겠다.인간은 사는 동안 셀 수 없이 죽는다고 했다. 이는 단지 생물학에 관한 이야기에 그치지 않는다. 우리의 손과 발은 의식의 범주 밖에서 새로운 것으로 교체되고 있겠지만, 이와 동시에 우리는 삶에 머무르고 싶다는 이유로 삶과 정신적으로 투쟁하며 살아간다. 스스로를 지키고자 수많은 것들을 억지로라도 바꾸려 노력한다. 누군가는 우리가 인간이기 전에 하나의 생명이라고 말할지 모른다. 하지만 개개인에게는 스스로가 하나의 소중한 생명이기 이전에 나 자신이며, 따라서 단지 살아있는 생명이 아닌 인간으로, 나로 남아있기를 원한다. 나를 지키고, ‘나’로서 머무르기 위해 인간은 셀 수 없이 스스로를 죽인다. 때로 타협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를 자아의 상실로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이 또한 스스로를 파괴하면서 나를 지키려는 하나의 동적 평형이다. 이렇게 ‘질서는 유지되기 위해 끊임없이 파괴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동적 평형의 메시지는 정신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인간의 삶의 과정에도 부합한다.
 평형은 여러 부분에서 유연성을 발휘한다. 변화하는 상황을 받아들이고, 변화에 발맞추어 스스로를 변화시킨다. 외부 환경은 끊임없이 변한다. 수업에서 배웠듯 나 이외의 주변 모든 것은 나에게 환경이 되며, 주체인 나 자신과 나의 환경이 상호작용하는 세계를 나의 생태계라고 말할 수 있다. 크게 보면 나와 환경이 상호작용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개인은 내가 환경의 자극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동적 평형을 유지하며 환경의 변화에 따르는 것처럼, 인간의 생각, 가치관 등의 많은 것들이 현재 내가 살고 있는 환경에 이끌리는 것이다. 외부환경에 굴하지 않고 평형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다.2017년 12월 18일 월요일 저녁, 한 아티스트가 세상을 떠났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목소리로 위로를 주던 그는, 무대 아래에서는 스스로가 가장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었다. 끊임없는 갈등과 투쟁 끝에, 결국 대중 앞에서 반짝이던 한 사람은 하늘의 별이 되는 길을 택했다. “난 오롯이 혼자였다. 끝낸다는 말은 쉽다. 끝내기는 어렵다. 그 어려움에 여지껏 살았다. 도망치고 싶은거라 했다. 맞아. 난 도망치고 싶었어. 나에게서. 너에게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아픈 건 나 때문이며, 모든 것이 내 탓’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한 사람을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으로 몰고 간 것은 외부 환경이다. 세상과 부딪히기 어려웠던 한 사람이 세상 사람들의 눈길을 받아내야 했고, 성격 탓이라는 의사의 섣부른 몇 마디가 또 다른 자극으로 다가와 날카로운 환경을 만들어냈다.책에서는 치명적인 결여가 아닌 경우 동적 평형계가 그 빈자리를 메우려 우회 또는 보충의 역할을 해낸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결여된 조각이 치명적일 경우 동적 평형계가 영향을 최소화 하려 노력해도 회복이 불가능하며 결국 작동이 멈추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동적 평형의 이 성질 또한 인간의 삶 전체를 관통한다. 그는 적응하려 했다. 몇 번이고 스스로를 죽였고 그러지 말라며 다그쳤다. 우회하려 노력했고 다른 요소들로 보충하려 노력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 물론 생명이 마무리되는 순간이 곧 한 사람의 종말로 여겨질 수는 없다. 당사자가 아닌 이상, 죽음이 ‘회복하지 못한 결과’, ‘이겨내지 못한 결과’라고 함부로 논할 수 없다. 생물과 무생물 사이의 경계는 모호하며, 살아있다는 의미의 ‘생물’로서의 삶이 끝났다는 것이 특정 가치의 종결 혹은 퇴색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평형은 여러 부분에서 유연성을 발휘한다. 변화하는 상황을 받아들이고, 변화에 발맞추어 스스로를 변화시킨다. 외부 환경은 끊임없이 변한다. 수업에서 배웠듯 나 이외의 주변 모든 것은 나에게 환경이 되며, 주체인 나 자신과 나의 환경이 상호작용하는 세계를 나의 생태계라고 말할 수 있다. 크게 보면 나와 환경이 상호작용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개인은 내가 환경의 자극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동적 평형을 유지하며 환경의 변화에 따르는 것처럼, 인간의 생각, 가치관 등의 많은 것들이 현재 내가 살고 있는 환경에 이끌리는 것이다. 외부환경에 굴하지 않고 평형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다.2017년 12월 18일 월요일 저녁, 한 아티스트가 세상을 떠났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목소리로 위로를 주던 그는, 무대 아래에서는 스스로가 가장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었다. 끊임없는 갈등과 투쟁 끝에, 결국 대중 앞에서 반짝이던 한 사람은 하늘의 별이 되는 길을 택했다. “난 오롯이 혼자였다. 끝낸다는 말은 쉽다. 끝내기는 어렵다. 그 어려움에 여지껏 살았다. 도망치고 싶은거라 했다. 맞아. 난 도망치고 싶었어. 나에게서. 너에게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아픈 건 나 때문이며, 모든 것이 내 탓’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한 사람을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으로 몰고 간 것은 외부 환경이다. 세상과 부딪히기 어려웠던 한 사람이 세상 사람들의 눈길을 받아내야 했고, 성격 탓이라는 의사의 섣부른 몇 마디가 또 다른 자극으로 다가와 날카로운 환경을 만들어냈다.책에서는 치명적인 결여가 아닌 경우 동적 평형계가 그 빈자리를 메우려 우회 또는 보충의 역할을 해낸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결여된 조각이 치명적일 경우 동적 평형계가 영향을 최소화 하려 노력해도 회복이 불가능하며 결국 작동이 멈추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동적 평형의 이 성질 또한 인간의 삶 전체를 관통한다. 그는 적응하려 했다. 몇 번이고 스스로를 죽였고 그러지 말라며 다그쳤다. 우회하려 노력했고 다른 요소들로 보충하려 노력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 물론 생명이 마무리되는 순간이 곧 한 사람의 종말로 여겨질 수는 없다. 당사자가 아닌 이상, 죽음이 ‘회복하지 못한 결과’, ‘이겨내지 못한 결과’라고 함부로 논할 수 없다. 생물과 무생물 사이의 경계는 모호하며, 살아있다는 의미의 ‘생물’로서의 삶이 끝났다는 것이 특정 가치의 종결 혹은 퇴색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생물로서의 삶을 마무리 지은 생물은 생물과 무생물 사이 어딘가에 위치하는가? 생물이었던 것이 생명활동을 멈춘 이후에는 그 존재가 생물에 속하게 되는지, 무생물에 속하게 되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보인다. 더 이상 살아있지 않으니 무생물인가? 혹은 살아있던 존재였으니 죽은 생물이라고 불러야 할까? 아니면 생물, 무생물 그 어떤 범주에도 속하지 못하는 걸까? 살아있는 인간으로서의 삶을 유지하는 일을 멈추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다. 주체를 개인으로 볼 때 모든 사람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모두의 생태계가 다르고, 그 생태계 속의 환경이 개인을 주체로서의 ‘나’가 아니게끔 만드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동적 평형이, 변화에 맞추어가는 또 다른 변화가, 환경에 지배당하는 인간이라는 방향으로 향하는 것이다.
생물로서의 삶을 마무리 지은 생물은 생물과 무생물 사이 어딘가에 위치하는가? 생물이었던 것이 생명활동을 멈춘 이후에는 그 존재가 생물에 속하게 되는지, 무생물에 속하게 되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보인다. 더 이상 살아있지 않으니 무생물인가? 혹은 살아있던 존재였으니 죽은 생물이라고 불러야 할까? 아니면 생물, 무생물 그 어떤 범주에도 속하지 못하는 걸까? 살아있는 인간으로서의 삶을 유지하는 일을 멈추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다. 주체를 개인으로 볼 때 모든 사람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모두의 생태계가 다르고, 그 생태계 속의 환경이 개인을 주체로서의 ‘나’가 아니게끔 만드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동적 평형이, 변화에 맞추어가는 또 다른 변화가, 환경에 지배당하는 인간이라는 방향으로 향하는 것이다.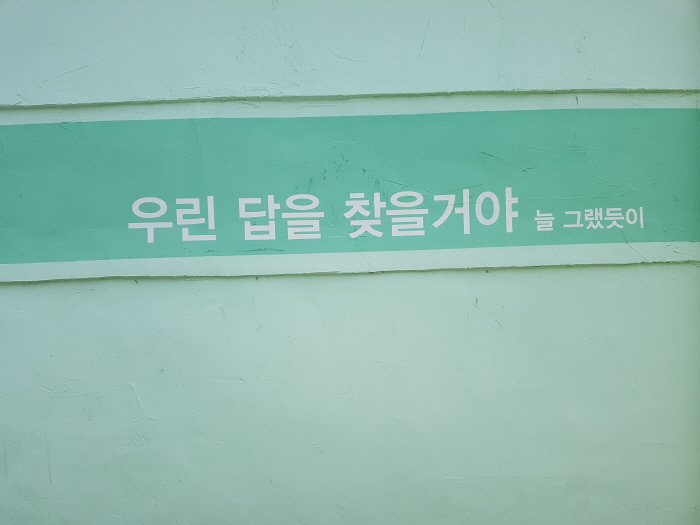 생물학적으로, 또한 이외의 모든 면에서 우리는 우리를 지키기 위해 필수적으로 변화해가야 한다. 그리고 이 변화에는 반드시 파괴가 포함되어 있다. 누군가는 이런 동적 평형 과정을 적응 또는 합리화라 말하고, 책에서는 이를 응답성, 가변성, 유연성 등의 성질로 표현한다. 앞서 말했듯, 유지하기 위해 유지해서는 안 될 것들이 있다는 것은 말 자체가 모순적으로 들리는 만큼 결코 쉽지 않은 과정임을 의미한다. 우리는 생명이기 이전에 인간이기에, 다른 생물과는 달리, 인간으로서 행해야 할 동적 평형이 추가적으로 존재한다. 인간이 정신적 산물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고 말할 수 있겠다. 지키기 위해 지니지 말아야 할 것이 있음과 동시에, 자아를 지키기 위해 지니고 나아가야 할 것들 또한 존재한다. 어쩌면 우리는 생물과 무생물의 사이 그 어딘가에 위치한 존재일지 모른다. 다만 책에서 말했듯 우리는 시간의 영향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만큼은 확실하다. 우리 각자가 시간의 흐름 안에서, 동적 평형 상태에 있는 하나의 흐름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이 지니는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김예린 에디터]<저작권자 ⓒ아트인사이트 & www.artinsight.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생물학적으로, 또한 이외의 모든 면에서 우리는 우리를 지키기 위해 필수적으로 변화해가야 한다. 그리고 이 변화에는 반드시 파괴가 포함되어 있다. 누군가는 이런 동적 평형 과정을 적응 또는 합리화라 말하고, 책에서는 이를 응답성, 가변성, 유연성 등의 성질로 표현한다. 앞서 말했듯, 유지하기 위해 유지해서는 안 될 것들이 있다는 것은 말 자체가 모순적으로 들리는 만큼 결코 쉽지 않은 과정임을 의미한다. 우리는 생명이기 이전에 인간이기에, 다른 생물과는 달리, 인간으로서 행해야 할 동적 평형이 추가적으로 존재한다. 인간이 정신적 산물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고 말할 수 있겠다. 지키기 위해 지니지 말아야 할 것이 있음과 동시에, 자아를 지키기 위해 지니고 나아가야 할 것들 또한 존재한다. 어쩌면 우리는 생물과 무생물의 사이 그 어딘가에 위치한 존재일지 모른다. 다만 책에서 말했듯 우리는 시간의 영향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만큼은 확실하다. 우리 각자가 시간의 흐름 안에서, 동적 평형 상태에 있는 하나의 흐름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이 지니는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김예린 에디터]<저작권자 ⓒ아트인사이트 & www.artinsight.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위로
위로 목록
목록


